‘자신이 근무하는 재단 관련 일은 바깥에 대고 입도 뻥끗하면 안된다?’
연세대학교 재단의 한 직원이 자신과 함께 일했던 동료의 죽음에 대해 언론과 통화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재단 쪽은 이 직원을 해임하려고 재단 정관에도 어긋나는 규정을 새로 만들기까지 했다.
지난해 10월28일 순천향대학교 노아무개(39·여) 교수가 아파트 화단에 떨어져 숨진 채 발견돼(▷ 연세대 재단 이사장 비서 출신 여교수, 의문의 추락사)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당시 <한겨레>는 ‘고인이 동료 교수들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유족들의 말과, ‘전 직장이었던 연세재단 쪽과 갈등이 있었다’는 지인의 말 등을 인용해 고인의 사인을 둘러싼 의혹을 보도했다.
고인과 함께 10년 넘게 일했고, 그가 숨지기 이틀 전에 만난 적이 있던 연세재단 직원 ㅇ(55)씨는 당시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노 교수가 ‘최근 협박성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말해 찾아가 위로해줬다”고 말했다. 이 말은 익명으로 기사에 인용됐다.
하지만 연세재단은 이 말을 근거로 지난 2월9일 ㅇ씨를 해임했다. 사유는 ‘노 교수의 장례식장에서 연세재단을 폄훼하는 발언을 해 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점, 언론사 인터뷰에서 노 교수를 고의적으로 ‘연세대 재단 이사장 비서’라고 표현해 재단이 노 교수의 사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한 점’ 등을 들었다. 하지만 ㅇ씨는 고인이 사망 직전 자신에게 했던 말을 단순히 전했을 뿐이고, 노 교수를 연세대 재단 이사장 비서라고 표현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또 연세재단이 ㅇ씨를 해임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무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세재단은 지난해 12월14일 ‘법인직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규정’을 개정했는데, 기존에 △법인 이사 △교수 △변호사 등으로 제한돼 있던 징계위 재심위원 자격을 바꿔 법인직원도 징계위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애초엔 징계위원을 임명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었으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변경했다. 연세재단은 12월에 개정한 규정을 근거로 두 달 뒤 ㅇ씨를 해임했다.
하지만 이는 징계 사유 발생 이후에 개정된 내용을 징계에 소급 적용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재단직원이 재심위원이 될 수 있어 재심 신청도 의미가 없어졌다. 또 법인 정관에도 위배된다.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정관’ 제59조는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도 법인직원을 재심위원회에 넣은 것이다.
이에 대해 연세재단 민지홍 사무부처장은 “정관은 교원에 적용되는 것이고 법인 직원은 독립된 징계규정을 둔다”며 “이번 해임은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세법인 정관 제88조는 “사무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사립대 관계자도 “사립대 법인의 정관은 ‘상위법’에 해당하는데, ‘하위법’ 성격인 규정에 정관과 위배되는 내용을 담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연세재단, 언론과 통화했다고 ‘직원 해고’
동료 죽음 발언으로 “학교명예 실추” 내세워
징계 규정까지 바꿔 소급적용…절차 논란도
송채경화기자
- 수정 2011-03-24 20:30
- 등록 2011-03-24 20:30

![[단독] 윤석열 관저 봉쇄령에 이광우 “미친 x들 다 때려잡는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221/53_17400898849481_5617398644549208.webp)

![[단독] “개혁신당, 김상민 공천받으면 김건희 개입 폭로하려 했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220/53_17400457288889_20250220503666.webp)
![[단독] 명태균, 이준석에 “문제 생기면 바로 김건희 사모님에게 연락해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220/53_17400341573106_20250220502787.webp)



![[속보] 법원, “검찰기록 헌재 주지 말라” 김용현 신청 각하](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221/53_17401077378182_20250221501642.webp)












![이 아픔 치유될 수 있을까…우크라이나 전쟁 3년 [포토]](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221/53_17401051018368_20250221501459.webp)




![‘뇌사 상태’ 안전교육 수두룩 [왜냐면]](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219/53_17399609833592_20250219503653.webp)






![‘국방장군’ 말고 ‘국방장관’이 필요하다 <font color="#00b8b1">[안 보이는 안보]</fon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477/286/imgdb/child/2025/0221/53_17400986960974_20250221500617.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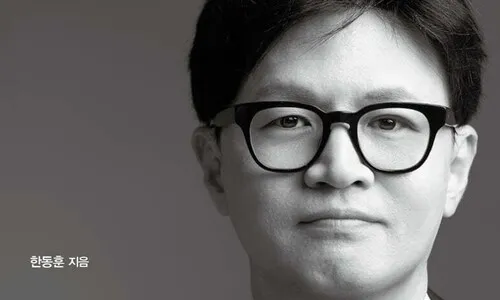

![탄핵 찬성 60%, 반대 34%…이재명 34%, 김문수 9%<font color="#00b8b1"> [한국갤럽]</fon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221/53_17401012685163_20250221501110.webp)



![<font color="#FF4000">[속보]</font> “검찰기록 헌재 주지 말라” 김용현 신청…법원 각하](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221/53_17401077378182_20250221501642.webp)
